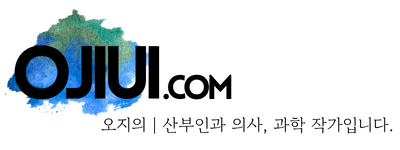“뱃속에 있을 때가 좋을 때다”는 말은 첫 임신을 했을 때 그리 와닿지 않는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다. 자궁 안에 있는 아기는 무조건 내가 데려가는 곳으로 간다. (태어난 아기는 안아주거나 도구를 써서 옮겨야 하고, 그마저도 말을 안 들을 때가 많다.) 뱉어내지 않고 내가 먹는 것을 나눠 먹는다. (태어난 아기는 게울 때도, 거부할 때도 있고 많다.) 아직 폐호흡을 못하니 시끄럽게 울지도 않는다. (태어난 아기는?.. 할많하않…^^) 아. 이쯤 되니 맞긴 맞다. 자고로 아기는 뱃속에 있을 때가 좋다.
아기가 탄생하며 새로운 국면이 펼쳐진다. 일단 아주 정성껏 양육해야 한다. 먹는 것, 싸는 것, 자는 것까지. 이를테면 아기가 젖을 잘 빨아먹는 것은 엄연히 엄마-아기 양측의 배움과 노력이 필요하다. 덩그러니 낳아놓은 것 만으로 당연스럽게 자라나는 아기는 없다. 이 미약한 존재를 살려두고 성장시키려면 끝없이 노력해야 한다.
글을 쓰는 것은 통제력이 꽤 높은 작업이다. 어쨌든 한 글자 한 글자를 작가인 내 맘대로 쓴다. 하지만 탄생한 책이 세상 속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은 그렇지가 않다. 책이 날개 돋친 듯 인기를 얻길 바라는 ‘내 맘’ 따위는 그 누구의 안중에도 없다. 다양한 경로로 사람들 눈에 띄어야 비로소 읽히고, 팔리는 책이 된다. 책은 나의 오롯한 돌봄을 벗어나, 타인을 적극적으로 의식하고 공략해야 하는 마케팅 세계에 진입하게 된다.
책을 알리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책 쓰기라는 큰 목표 앞에서 내가 별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분야였다. 출판사에서 어떻게 잘~ 좀 해주지 않을까? 막연히 기대만 했다. 하지만 신간 홍보는 결코 녹록지 않다. 우습게도 성공적인 마케팅의 첫 장벽은 내가 책을 아주 살금살금 썼다는 것이다. 지금도 나의 가족과 몇몇 지인 말고는 내가 책을 썼다는 것을 모른다. (나를 고용한 원장님도 모른다.) 사적인 이야기가 많아 여기저기 알리기 부끄럽기도 하거니와, 진료하는 의사인 나와 글을 쓰는 나를 따로 떼어두고 싶었다. ‘본캐’로 특정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이름도 숨겼다. 이전에 실명으로 신문에 수필 등이 실려 퍼져나간 적이 있는데, 별 내용 없었음에도 댓글로 욕을 꽤나 먹은 적이 있다. 글에 내 이름이 박혀있다 보니 괜히 위축되고 의욕이 꺾였다. ‘부캐놀이’가 유행해서가 아니고, 나 같은 유형의 인간은 이렇게 자아를 어느 정도 분리하지 않으면 글쓰기에 제약이 생긴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아무튼 이런저런 사정이 있을지언정 작가의 ‘특정되고 싶지 않다’는 바람은 홍보에 방해가 된다. 이를테면 나는 의사로서의 이력이 이 책의 소개에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저자 소개문에 넣지 않았다. 전문서적을 출판할 거라면 학력과 임상 경력, 연구 성과가 중요하겠지만 《출산의 배신》은 교양서라 애초에 그렇게 깊은 내용을 다루지 않는다. 약력은 불필요하다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한 줄짜리 저자 소개문을 써서 보냈다. ‘의사, 애기엄마, 과학 커뮤니케이터’. (어휴, 답답한 아줌마 같으니. 이래서야 이걸 누가 사서 봐?!) 대표님이 이걸 보고 뜨악하셨던 것 같다. 출판사에서 재차 부탁을 해와서 학력이 추가되었다. 고민하다가 수련 병원은 밝히지 않았다. 근무지를 노출하는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다. 출판사 대표님, 황당하셨죠…? 지금도 죄송스럽다.
이상스러운 행보이긴 하다. 유명해지기 위한 온갖 무리수가 쏟아지는 시대다. 게다가 나는 무명작가. 이 악물고 온몸 비틀기를 하지 않으면 신간 하나가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다. 고생해서 쓴 책을 아무도 읽어 주지 않는 것만큼 아쉬운 일도 없을 것이다. 출간 마무리 작업에 지쳐서 막상 신간 홍보를 나 몰라라 하고 있다가 깨달았다. 갓 태어난 내 책이 젖을 달라고, 기저귀가 젖었다고, 잠을 재워 달라고 응애응애 울고 있었다. 콘텐츠 홍수의 세상 속에서 이 책을 잘 키워내는 것도 나의 몫인 것이다. 허겁지겁 인스타그램 게정을 만들었다. 브런치에 글을 올렸다. 홍보 이미지를 직접 만들었다. 신문 인터뷰도 응했다. 지금은 웹사이트도 만들고 있다.
책을 쓰는 것은 대체로 나의 자율과 의지 안에서 해결된다. 내가 원고를 붙들고 있는 동안은 이 녀석이 내 품을 벗어나지 않았다. 다만 책을 홍보하는 것은 타인을 적극적으로 의식하고 추동하는, 또 다른 종류의 동력이 필요하다. 고지식하게도 열심히 쓰기만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틀렸다! 자고로 육아는 임신보다 무거운 법이다. 기껏 책을 낳아놓고 모른 척할 수는 없다. 애초에 책이 잘 안 읽히는 세상 아닌가. 그러니 부모 된 자로서 고상만 떨 수는 없다. 책의 생명력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키려면, 부단히 고민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