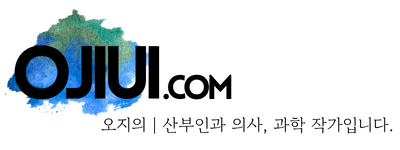과거 대학병원에서 근무할 당시의 전형적인 회진 풍경이다. 나는 한 손에 볼펜, 다른 손에 수북하게 환자 명단, 경과에 대한 메모와 검사 결과지를 들고 분주하게 산과 병동을 누빈다.
“산모분, 오늘 좀 어떠세요, 증상은 괜찮나요?”
핼쑥한 얼굴의 산모가 대답한다.
“괜찮아요.”
“아기는 잘 놀고요?”
“네, 태동도 잘 느껴져요.”
“다행입니다. 오늘 검사 결과는 이만저만하고요, 혹시 이런저런 변화가 생긴다면…”
당시에는 미처 전부 헤아리지 못한 것이 있다. “괜찮아요”라는 산모의 짧은 대답에는 앞에 생략된 것이 무척 많다는 사실.
환자 침대는 딱딱해서 등이 배겨오고,
혈관에 꽂힌 굵은 바늘은 영 성가시고,
밤낮으로 온갖 검사를 진행하느라 도저히 잠을 푹 잘 수가 없고,
소변줄이 아파서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고,
종일 누워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못 견디게 좀이 쑤시고,
집에 있는 가족들이 눈물 나게 보고 싶고,
무엇보다 뱃속의 아기가 걱정되어 불안한 마음에 하루 종일 시달리지만…
그래도, 저는 괜찮아요.
누구나 치료 과정이 힘들다곤 하지만
원래 모든 병이 그렇다. 낫기 위해 받는 치료지만, 그 과정 자체가 힘들다. 수술을 받거나 항암 약물 치료처럼 크게 부담스러운 치료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금연•금주처럼 생활 습관을 바꾸거나, 입원을 위해 일상을 잠시 멈추는 것도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질환이 따라 경중은 다를지언정, 의료적 처치를 참고 견뎌주는 환자의 협조가 있어야 치료가 효과를 발휘한다. 약을 처방대로 먹는 것도, 자기 증상을 잘 살펴보는 것도, 꼬박꼬박 병원에 오는 것도 모두 귀한 노력이다. 그런데 고위험 산모의 버팀에는 유독 각별한 의미가 있다.
산모와 태아는 연결되어 있지만 엄연히 타자이다. 그래서 생물학적 이해관계가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 고위험 임신에서 대체로 더 위험한 쪽은 태아이다. 임산부는 성체이고, 태아는 아직 미성숙체이다. 그러니 위험의 정도가 비대칭적인 경우가 빈번하다. 물론 고위험 임신 중에는 임신부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질환도 존재한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라면 태아도 무사하기는 힘든 법이다.
엄마는 스스로의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태아를 위해 기꺼이 치료 과정에 동참한다.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도 꽤나 고된 것이 임신이다. 그런데 고위험 임신이라면 산모 본인이 아프거나 불편해서가 아니라, 태아의 생명과 건강을 고려하여 치료를 받는다. 통상 의학적 치료가 당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힘겨운 과정 속에서도 위태로운 임신 상태를 견뎌내는 것은 그 본질상 이타적이다.
태아를 향한 치료도 반드시 모체를 매개로 해야 전달될 수 있다. 나는 조기진통으로 산부인과에 입원했을 때 폐성숙주사를 맞았다. 물론 이미 다 자란 내 폐를 성숙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다. 34주 이전에는 태아의 폐기능이 온전하지 않아서 호흡이 어렵다. 따라서 조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태아 폐성숙을 돕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다. 주사는 내가 맞지만, 나에게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필요 없다. 단지 주사 성분을 아기에게 전달하기 위해 길을 내어 주는 것이다. 임신성 당뇨 관리도 유사한 면이 있다. 임신 중 혈당 상태는 모체에도 영향이 있지만, 단기적이자 직접적인 영향은 태아 쪽에 더 심각하다. 따라서 태아 합병증 예방을 위해 혈당 조절을 해야 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모체를 매개로 한 식단과 약물에 달려 있다. 밥을 맘대로 못 먹는 것도 엄마고,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것도 엄마다.
버팀의 의미가 빛나는 순간
임신 19주, 자궁경부무력증을 진단받았다.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 자궁 입구가 일부 벌어져서 금방이라도 아기가 쏙 빠져버릴 것만 같았다. 다급하게 입원해서 약한 자궁 입구를 실로 묶어 보강하는 수술을 받기로 했다. 혈관 확보와 수술 전 검사를 위해 팔뚝을 찔렸다. 소변줄을 꽂을 때는 아파서 악 소리가 나왔다. 항생제 피부 검사를 받을 때는 눈물이 찔끔 돌았다. 몸을 돌돌 만 채로 허리에 바늘을 꽂아 척추 마취를 받았다. 마취를 했어도 어느 정도의 통증과 불편은 견뎌야 했다. 수술이 끝나도 며칠이 지나서야 퇴원할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엔 2주간 답답함을 견디며 누워 지냈다.
무서우리만큼 극단적인 상상을 해보자. 내 몸뚱이만 따로 떼어내서 생각하면, 굳이 이 과정을 견디며 수술을 받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나는 수술 전에도 통증이나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않았다. 만약 자궁경부무력증이 유산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내 신체에 미칠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다. (물론 정신적인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겠으나, 사고 실험을 위해 별개로 가정해 보자.) 출혈, 감염 같은 일반적인 유산 합병증은 치료로 해결이 가능하고, 한두달 정도면 신체 상태는 회복될 것이다.
하지만 자궁입구가 마저 열려 아기가 나와 버린다면, 내 아기는 틀림없이 즉시 죽는다. 19주 태아를 자궁 밖에서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 돌이킬 수 없는 소멸이다. 그러니 아기를 살리기 위해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 순간 나는 고위험 임신 환자이며, 발언권 없는 태아 대신 수술을 받겠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동시에 치료가 목적을 달성하도록 내 몸을 내어주어야 했다.
산모에게는 힘든 나날이, 태아에게는 더 나은 생존력을 획득하는 기회일 수도 있다. 산모에게는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 덕분에, 태아는 생의 빛을 보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 버티는 것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고, 넓은 의미의 치료라고 할 수 있다. 고위험 임신부는 환자이면서, 태아를 대리하는 보호자이며, 치료 수단의 매체이다. 이처럼 다층적인 정체성을 지닌 고위험 산모의 노력은 자연히 각별할 수밖에 없다. 의사 입장에만 머물렀을 때는 온갖 숫자와 패턴에 집중하느라 다 헤아리지 못했던, 지극한 인내와 각오가 비로소 시야에 들어왔다.
퇴원하는 날, 집도해 주신 교수님이 나에게 말했다.
“산모님도 산부인과 의사니까, 이제 뭘 해야 하는지 잘 알죠? 우리 끝까지 버팁시다.”
나에게도 왔다. 버팀의 미덕이 힘을 발휘할 시간이.